내 몸의 시간

‘지금’ 뜨고 있는 편물은 언제나 빨리 끝내버리고 싶은 애증의 대상이다.
다음으로 뭘 뜰지 고민하는 게 가장 재밌다.
소셜미디어에 올라오는 예뻐 보이는 남의 작품은 저장하고 캡처하기 바쁘다.
이번에 뜬 카디건도 마찬가지였는데 설상가상으로 얇은 모헤어를 3겹으로 직접 합사해 떠야 해서
빨리 끝내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했다.
모헤어는 털 날림이 심하다는 단점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시작한 탓이다.
털이 긴 고양이를 키우는 것도 아닌데 뜨는 내내 털 범벅이 된 채 돌아다녔다.
색 감각이 뛰어난 것도 아니면서 원작과는 다른 내 마음에 쏙 드는 색의 실을 골라버리는 바람에
완성을 하고 나면 과연 예쁠지 알 수 없는 것 역시
큰 스트레스 중 하나였다.
결과적으로는 몸을 감싸는 넉넉한 크기도,
살결에 닿는 모헤어의 폭담함도
(털 날림은 감수하고),
살짝 튀는 색 조합도,
어깨선을 타고 흘러내리는 디자인도
모두 만족스러운 첫 번째 ‘의류’,
모헤어 가디건이 탄생했다!

쉽게 뜨는 탑다운 니트 - 모헤어 카디건 (로비 키드 모헤어)
카디건 도안은 엄마의 뜨개질을 2년 만에 무려 35억으로 만든 26살 김대리!로 유명한
유튜버 김대리님의 책 [쉽게 뜨는 탑다운 니트]에서 골랐다.
http://book.naver.com/bookdb/book_detail.naver?bid=16356695
쉽게 뜨는 탑다운 니트
도안이 간결하고 짧아 아무 생각 없이그대로 따라 하기만 해도 멋진 스웨터를 완성할 수 있어요!‘바늘이야기 김대리’ 클래스101 공예부문 1위목부터 아래로 한 번에 쭉 뜨는 탑다운 니트탑다
book.naver.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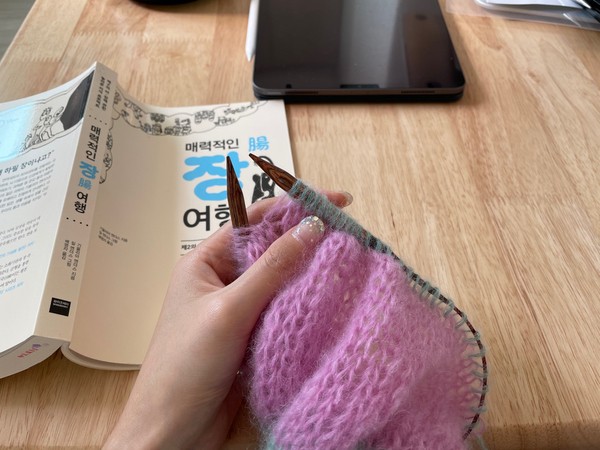
내가 고른 카디건은 책에 나와있는 다른 니트들 보다 훨씬 간단하고 단순해 보였다.
당연히 처음 떠보는 의류이기에
막히는 부분이 나올 때면 답답한 마음이 솟구쳐
손에서 던지듯 내려놓을 때가 잦았다.
동영상 강의가 간절했다.
보고 따라 뜨기만 하면 될 텐데!
풀고 다시 뜨고 고민하는 시간 없이 넙죽넙죽 받아먹는 요령을 부리고 싶었다.
연초에 열심히 전 작품인 숄을 뜨고 있을 때 엄마가 지나가듯이 말씀하셨던 게 떠올랐다.
(이때도 나는 뜨개는 왜 이렇게 어렵냐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엄마 때만 해도 뜨개로 뭘 만든다고 하면 카디건, 스웨터쯤은 기본으로 생각했다고 한다.
엄마는 친구가 입고 온 품이 큰 회색 터틀넥 니트가 예뻐 보여 직접 떠서 입고 다녔고
중학생 때 처음으로 뜬 건
주머니가 달린 카디건이었다고 한다.
놀라웠다. 유튜브는 고사하고, 문장으로 된 설명 만으로 옷을 떠냈다고?
무늬가 들어간 목도리도 살짝 버겁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처음부터 카디건을 뜰 생각을 하지?
당신 세대에는 그게 왜 당연한 거였을까?
계속해서 궁금증이 떠올랐다.

비약일 수 있지만 지금처럼 즉각적으로 내가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없는 환경에서 자란 세대와
클릭 한 번에 바로 내가 필요한 반응을 보여주는 것이 당연한 환경에서 자라나는 지금 세대의 차이는
이렇게 뜨개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것 같다. 내가 그러고 있으니까!
나는 1994년 생으로 저 중간에 끼어있는 세대인데,
우리가 아날로그 감성이라며 향수를 느끼고,
더 나은 가치인 것 마냥 추구하는 것들이
지금처럼 태어나자마자 스마트 기기에 노출돼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전혀 당연한 것이 아닐 텐데.
이 아이들이 지니게 될 신체 감각은 우리와는 또 다를 텐데~

모든 게 점점 더 빨라진다.
양질의 차이는 있겠지만 원하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간도, 절차도 과거에 비해 단축됐다.
종이 위의 문장을 읽고, 인지하고, 행간의 연결을 사유하기보다는
영상을 시청하고 다음 자극을 찾아 나서기에 바쁘다.
그런 속도를 우리의 몸은 제대로 쫓아가고 있을까?
우리의 몸도 세상이 변하는 속도와 비슷하게
빨라지거나, 단계가 축소되고, 퇴화하거나 발달하고 있을까?
여전히 밥을 먹으면 충분히 씹어 넘겨야 하고
소화시키기 위해 음식물이 위에서
머물러야 하는 시간이 있으며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충족시켜 주어야 하는 수면시간이 있다.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세상의 속도에 익숙해진다고 해서,
신체가 그 반응을 당연히 쫓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

어쩌면 그래서,
요가를 하면서도,
(요가가 아닌 몸을 쓰는 다른 모든 움직임이 마찬가지로)
원하는 자극과 결과물이 보이지 않는다고
조바심 내고, 재촉하게 되는 것일 수도 있다.
세상의 속도와 신체 속도의 간극을
어떻게 느끼고 잴 수 있는지,
실제로 세상은 얼마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그 변화가 내 몸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정말로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과
이전 세대의 뇌와 몸에는 차이가 있는지.
무엇이 더 나은지를 감히 논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면 나도 잘 모르겠다.
관련된 유의미한 연구 결과가 있어 공유해 주신다면 감사한 마음으로 읽어보고 싶다.
그 와중에 확실한 건,
적어도 매트 위에서 수련하는 동안만큼은
자꾸만 바깥으로, 외부로 향하던 감각을
온전히 내 몸과 마음으로 불러들이고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두 눈을 감고 척추를 곧게 세워 앉는다.
깊은 호흡을 초대한다.
몸 구석구석까지 숨을 실어 보낸다.
하루를 보내는 동안 나도 모르는 새 끼어든
내가 아닌 것들을 발견하고,
내쉬는 숨에 함께 밖으로 내보낸다.
온몸을 움직이다 보면
가볍게 송골송골 맺히던 땀이 어느새 뚝뚝 떨어진다.
동작마다 한 호흡, 한 호흡,
정성스레 맞춰 움직이다 보면
수련자는 알 수 있다.
매트 위로 떨어진 땀이 좋은 땀이라는 걸.
백날 수련한다고 해서 갑자기 짠! 하고
성인이 되는 기적은 물론 없지만
매일매일 정화할 수 있는 시간을 보내기로
선택한다는 것
내 몸의 속도를 느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의 의미를
날마다 새로이 알 수 있다.
저절로 알게 된다.